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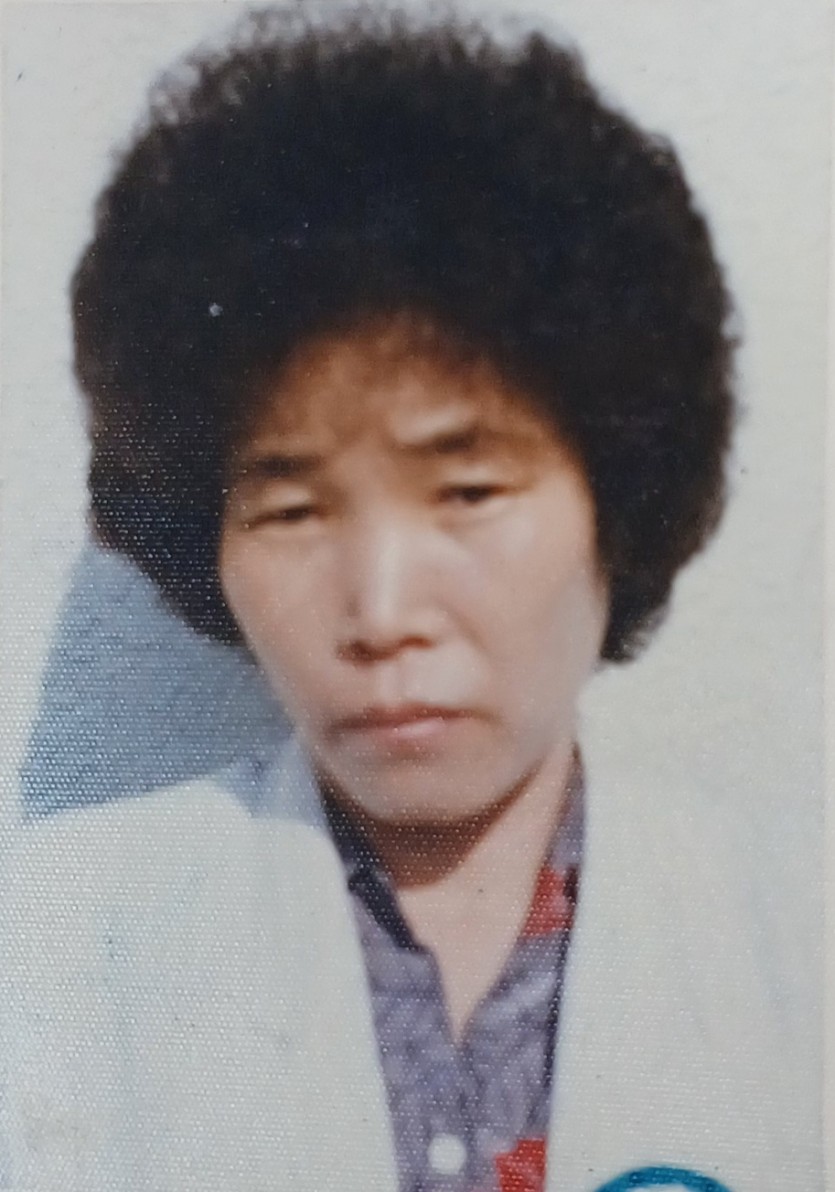
10여명(餘名)의 대가족(大家族)의 맏며느리로 들어간 김섭이(金燮伊) 여사(女史)는, 결혼(結婚)한 다음 날부터 남편(男便)과 시(媤)동생이 객지(客地)에서 품팔이를 하게 되매, 그 자신(自身)도 찢어지는 가난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 없어서 힘겨운 막노동(勞動)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김여사(金女史)는 슬하(膝下)에 네 자녀(子女)를 둔 후(後) 더욱 어려운 곤경(困境)에 빠져들어갔지만, 가난을 행복(幸福)으로 알면서 꿋꿋이 살아갔다.
그런데 가난은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돈벌이를 한답시고 객지(客地)로 나간 남편(男便)의 소식(消息)이 끊어지면서 지금껏 생과부(生寡婦)로 살아야만 했던 그 쓰라린 고통(苦痛)은, 지금도 뇌리(腦裏)에서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외와 같은 고통(苦痛) 속에서도 시부모(媤父母)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항상 웃는 얼굴로 공경(恭敬)하면서, 특히 생신(生辰)에는 이웃 어른들을 초청(招請)하여 맛있는 음식(飮食)을 대접(待接)하는 등, 비록 가난은 했지만 효심(孝心)만은 부자(富者) 못지않았다.
어디 그뿐이랴. 시숙부(媤媤叔)가 질녀(姪女) 2명(名)을 남겨놓고 어디론가 행방불명(行方不明)이 되는 바람에 자신(自身)이 낳은 네 자녀(子女)와 함께 여섯 자녀(子女)를 양육(養育)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거기다 또 시부모(媤父母)님과 시(媤)동생들까지 책임(責任)져야 할 몸이었으니 세상(世上) 이다지도 무거운 짐이 또 어디 있으랴?
‘모든 것이 내 팔자(八字)가 사나운 탓이다. 그렇다고 나마저 이들을 외면(外面)해 버리면 그 결과(結果)가 어떻게 되겠는가? 비록 연약(軟弱)한 여자(女子)의 몸이긴 하지만 최선(最先)을 다해서 사랑과 봉사(奉仕)를 베풀자.'
김여사(金女史)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운명(運命)으로 돌리고 그 자신(自身)이 십자가(十字家)를 메기로 결심(決心)했다.
따라서 그는 당장 식구(食口)들을 굶주림이란 늪에서 건져 내기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닥치는 대로 막노동(勞動)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신(自身)보다 불우(不遇)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기도 했는데, 그 좋은 예(例)가 이웃에 살고 있는 영세민(零細民) 노인(老人) 김진홍씨가 폐병(肺病)으로 고생(苦生)하고 있는 것을 목격(目擊)하고 지금까지 6년(年) 동안을 의복(衣服)과 이불 등 일절(一切)의 빨래를 도맡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콩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식(飮食)을 같이 나누어 먹는 등, 뜨거운 인간애(人間愛)를 베풀어 온 일을 손꼽을 수 있겠다.
또한 남달리 애향심(愛鄕心)이 두텁기만 한 김여사(金女史)는 부녀사업(婦女事業)에도 눈부신 활동(活動)을 하고 있는데, 특(特)히 그는 어머니 회원(會員) 60여명(餘名) 중에서 절미(節米), 저축(貯蓄)을 가장 많이 한 억척스러운 모범여성(模範女性)이기도 하다.
“인내(忍耐)는 모든 덕(德)에서 최미(最美)·최귀(最貴)·최희(最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는, 오늘도 웃는 얼굴로 시부모(媤父母)님의 방(房)과 자녀(子女)들의 방(房)을 드나들면서 사랑과 봉사(奉仕)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 이전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정태선(鄭泰先) 25.06.09
- 다음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김동완(金東婉) 25.06.09